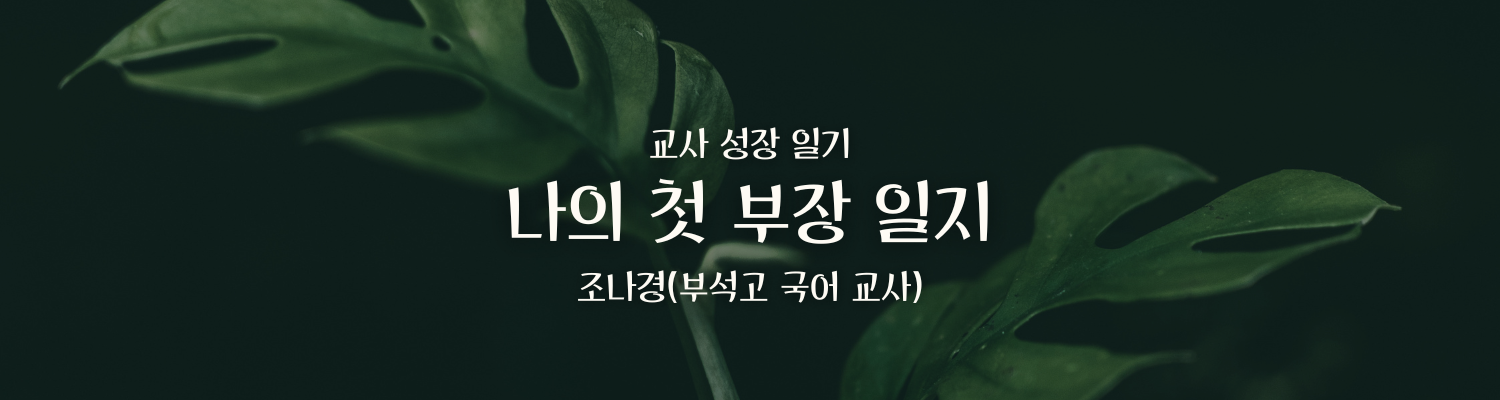나의 첫 부장 일지
조나경(부석고등학교 국어교사)
업무 희망원은 신중하게
학년말, 업무 희망원을 쓸 때는 모든 수를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 나는 작년까지 4년 차 교사였다. 그중에서 3년을 내리 고3 담임이었다. 교직 인생 75%를 고3 담임으로 산 것이다. 고3 담임, 장점도 물론 있지만 교직 인생 80%를 고3 담임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우리 학교의 고3 담임의 선호도는 거의 0에 수렴했고, 했던 사람이 또 할 가능성이 커 보였다. 고1 담임이 되길 간절히 빌었다. 그래서 1월에 업무 희망원을 제출하라고 할 때, <1지망 고1 담임, 2지망 고2 담임, 3지망 1학년 부장>을 썼다. 이것은 내가 절대 고3 담임을 하고 싶지 않음을 격렬하게 보여주는 업무 희망원이라고 생각했다. 3지망이 실현될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호기롭게 적어냈다. 아! 그것은 나의 크나큰 착각이었다. 나는 1급 정교사, 언제든 부장을 해도 문제가 없었다. 비록 좀 어린(?) 축에 끼긴 하다만…. (이 일로 내가 깨달은 사실은 1∼3지망을 다 채울 필요가 없으며,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으면 차라리 1∼3지망을 똑같이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몰랐던 분이 계신다면 교직 꿀팁으로 기억하시길….)
3지망에 ‘부장’을 적은 죄(?)로 나는 부장이 되었다. 올해 부장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하고 싶은 사람이 매우 적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3지망대로 되지는 않았다. 1학년 부장이 아닌 ‘교육과정부장’을 맡게 되었다. 교육과정부는 우리 학교에서 올해 신설된 부서였다. 교육과정부장의 업무는 크게 ‘학교 교육과정 업무 전반 총괄+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봉사) 업무 총괄’이었는데, (왜 창체 업무가 교육과정부 업무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듯하여 적자면, 우리 학교는 혁신학교로 담임은 업무가 없고 부장들이 업무를 전담한다. 창체 업무를 맡을 부서가 특별히 없어 신설된 우리 부서로 넘어 왔다.) 울며 겨자 먹기로 부장이 된 나에게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부서 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창의적 체험활동만 신경 쓰면 될 거라고 하셨다. 나는 그 말만 철석같이 믿었다. (나는 어리석었다. ^^…)
3월, 공노비의 삶 시작!
안타깝게도 내 업무의 전임자 선생님들께서는 전근과 명퇴로 학교에 계시지 않았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3월이 되었다. 해야 할 일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그런데 뭐가 뭔지, 언제 뭘 해야 하는지를 몰랐다. 이때 신규 때 첫 담임을 맡았을 때의 기분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막막함과 어찌할 바를 모름. 다행인 건 신규 때처럼 울지는 않았다. 불행인 건 신규 때는 알려주는 부장님, 선배 선생님들이 계셨다면 이제는 혼자였다. 이때 깨달은 점은 처음 부장을 맡으면 처음 담임을 맡을 때처럼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었다. (처음 부장을 맡은 선생님이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줍시다!) 또한 부장님들이 부장이란 이유로 어디 가서 어려운 내색도 못 하셨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3월은 한 달은 업무 파악과 업무 수행을 위한 야근의 연속이었다. (주말, 대통령 선거일에도 학교에 나갔다.) 나는 초과근무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적기에 민망하지만, 초근 57시간 만땅을 찍었다. (돈 안 받고, 못 받은 시간도 많았다. ㅠㅠ) 신규 3월, 한 달 내내 야간자율학습 임장 들어갔던 때와 같은 초근 시간이었다.
삽질하느라 쓴 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어찌 됐건 3월 한 달 고생한 덕에 당장 급한 불이었던 창의적 체험활동 업무를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때 서야 아주 조금 부장의 삶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부장을 하면서 ‘나’라는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었는데, 나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주고 싶은 욕구가 크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구성원의 희망 사항을 듣고 반영하다 보니 일 처리가 늦어졌다. 이런 ‘나’를 돌아보면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 내 선택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면, 마음 아프더라도 불만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을 배우게 되었다.
학교는 ‘함께’하는 곳
한숨 돌렸다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교육과정 박람회’. 지금까지는 교육과정 박람회를 열지 않았던 우리 학교, 이제는 ‘교육과정부’가 생겼으니 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교육과정 박람회를 여는 학교의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했다. 교과별 부스 운영과 과목 선생님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명 중에 어떤 방법이 나을지 고민했다. 전자는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는 데에 좋을 듯하지만, 선생님들이 피곤하다. 후자는 선생님들이 비교적 편하지만, 학생들이 잘 듣고 필요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지가 의문이었다. 고민이 컸다. 전자를 망설임 없이 선택하고 싶었는데 선생님들의 원성이 두려웠다. 처음 하는 교육과정 박람회다 보니 더 걱정스러웠다. 고민 끝에 부스 운영 방식으로 결정했다. 나의 걱정과는 다르게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방식을 긍정해주셨다. 이때 느낀 건 걱정을 사서 하지 말 것!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더 이로운 방식을 긍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었다.
교육과정 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았다. 인증 도장 주문하는 자잘한 일에서부터 당일 세부 운영 계획과 같은 큰일까지. 시간과 인력은 제한적인데 혼자서 일을 하려고 하니 정말 힘들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시점, 전체 회식을 했다. 회식을 갈까 말까 하다가 죽상으로 회식에 갔다. 그 모습을 보고 작년 3학년 부장님께서 “일을 왜 혼자 다 하려고 해? 샘은 총괄하는 역할이야.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한테 일을 부탁해. 내가 학년 부장님들 모시고 가서 도와줄게.”라고 말씀하셨다.
‘내 일인데 누구에게 부탁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 때문에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했다. 부탁드리는 것도 죄송스럽게 느꼈다. 그런 와중에 부장님의 말씀이 정말 감사했다. 정말로 부장님은 학년 부장님,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나의 일을 도와주셨다. 손을 쓰고, 힘을 써야 하는 일들을 도와주시니 일이 금방 끝났다. 그 덕에 교육과정 박람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목 선택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설문에는 94%가 ‘그렇다’에 응답을 하였다.
교육과정 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점은 학교는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내 업무가 아니라도,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할 때 그 일이 쉬워지고 빨라진다. 이전에 나는 내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선생님들을 외면한 적은 없었는가, 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발 벗고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1학기가 끝났다. 2학기에는 고교학점제 공간조성 사업, 2∼3차 과목 수요조사, 2023년도 교육과정 편제 작성,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관련 예산 소진 등등의 일이 남아 있다. 어찌어찌 큰 산을 넘고 넘으면 늘 그렇듯 한 해도 다 끝나 있을 것이다…. (2022학년도 평가회 때, 업무 개선 사항을 잊지 말고 써야지. 흐흐) 나는 올해 부장을 처음 맡으며 나라는 사람, 부장으로서의 새로운 무게, 학교라는 곳의 의미를 배우고 있다.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즐겁다.
올해 제 쿨 메신저의 상태 메시지는 ‘생존’입니다. 부장으로서 잘 살아남는 것이 제 올해 목표입니다.
웃기는 선생님·사람이 되고 싶지만, 본성이 ‘웃김’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웃기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